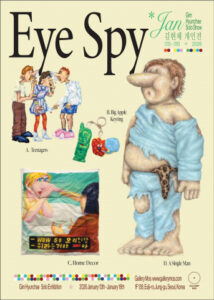치유 예배의 문화적 기호 – 현대인의 영성과 디지털 시대의 신앙 공동체
2026년의 첫 치유집회가 서울 한복판에서, 그것도 자정 무렵 온라인 생중계로 전 세계에 확산됐다는 소식은 어쩌면 단순한 종교 행사 그 이상일지 모른다. 만민중앙교회의 이수진 목사는 예레미야서를 인용해 ‘악행에서 돌이키라’는 설교를 전하며 36개국 신도와 실시간으로 기도를 나눴다. 신앙이 오프라인 예배당을 넘어 디지털 신전으로 옮겨 간 이 순간은, 시대의 감정과 기술이 만들어낸 새로운 종교적 경험을 예고한다.
우리는 이 거대한 ‘치유의 서사’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 기독교 집회의 형식을 넘어, 이것이 담고 있는 시대정신에 대해 진지하게 묻고 싶어진다.
신앙은 언제나 공동체의 언어요, 치유의 연출이었다
오랜 시간 동안 종교는 공동체의 마음을 묶는 서사의 코어였다.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듯, 성령의 역사는 예배라는 반복과 형식 속에 감정의 질서를 부여했다. 그런데 21세기의 신앙은 이전과 전혀 다른 그릇에 담긴다. GCN 위성방송, 유튜브 채널, 실시간 기도 접수 시스템 등 만민중앙교회의 이번 집회는 영적 욕망이 기술을 매개로 분출되는 디지털 종교 콘서트에 더 가깝다.
다르게 말하자면, 오늘날의 ‘종교적 환희’는 향이나 성가보다 클릭과 자막, 생방송 카운트다운으로 촉발된다. 더욱이 간증의 파급력은 사적 회심의 고백에서, 댓글과 링크를 타고 퍼져나가는 감정의 증식으로 바뀌고 있다.
이 상황은 단지 기술의 진보 때문일까, 아니면 현대인의 신앙 감각이 변한 것일까?
믿음은 이제 물리적 모임이 아니라 감응의 네트워크다
조용한 기도를 위해 교회를 찾기보다는, 공중파 대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해외 신도와 함께 치유 기도를 올리는 이 흐름은 단순한 편리함에 대한 탐닉이 아니다. 그것은 현대인이 마주한 고립 속의 구조적 외로움의 반증일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며 우리는 ‘접촉 없는 연결’에 익숙해졌고, 그 연결 안에서 감정을 나누는 새로운 공감의 기술을 발전시켰다. 이번 집회에 36개국의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올렸다는 건, 종교가 국경을 넘어 디지털 공통어로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다. 중요한 것은 정보가 아니라 감응이다. 연대가 아니라 공명의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수진 목사의 설교가 ‘악행에서 돌이키라’는 고전적 메시지를 담고 있음에도 새롭게 들리는 건, 그 말이 지금 우리 시대의 정서적 결핍을 두드리는 감정의 코드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시 묻는 치유란, 실제로 무엇인가?
“당신의 삶에 오늘 필요한 치유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 질문은 더 이상 의료의 어휘로만 응답되지는 않는다. 마음이 병들었고, 공동체가 해체되었으며, 관계가 비우호적으로 변질된 이 시대에 ‘치유’는 신체 너머의 정서적 구조를 단련하는 사회적 행위로 다뤄지고 있다.
그렇기에 치유집회의 의미는 이수진 목사의 말처럼 단순히 병의 완화를 넘어서 잘살기 위한 감각의 재구성이 된다. 믿음이 의심을 이긴다는 스토리는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집단이 지속성을 가지고 살아남기 위한 문화적 내성의 장치가 되는 셈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전통적 형식처럼 보이는 집회가 오히려 혁신적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힐링 예능이 아니라, 영적 공감의 플랫폼이다
치유집회라는 오랜 전통은 그 형식을 버리지 않고도, 디지털 기술과 시대감각을 입으면서 스스로를 재구성하고 있다. 이는 종교만의 일이 아니다. 문화의 모든 장르—음악, 전시, 책, 영화—가 결국엔 감정을 매개로 소통하고, 존재를 회복하는 공동의 메타포를 만든다는 점에서 같다.
당신의 하루에도 그런 감정적 치유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면, 정답을 찾기보다 질문을 던져보길 바란다. 무엇이 나를 꿈꾸게 만들고, 어디에서 나의 마음은 다시 숨을 쉬는가?
그리고 오늘, 잠시 유튜브를 켜고 자신만의 치유를 위한 의식을 만들어보라. 그것이 신앙이든, 시든, 단 하나의 문장이든, 당신을 품에 안을 수 있는 문화의 손길은 늘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