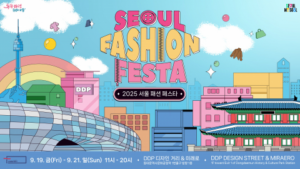한복이 만든 세계의 감탄 – 현대 라이프스타일 속 '전통 패션의 진화'가 말하는 것
2026년 파리패션위크, 낯익으면서도 신선한 이국적 풍경이 세계 패션 관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K-스타일리스트 배선영이 선보인 크리에이티브 스타일링은 명확했다. 한복, ‘입는 전통’을 넘어 ‘살아있는 라이프스타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녀는 로에베, 샤넬, 디올 등 글로벌 럭셔리 하우스의 컬렉션 현장에서 전통 한복의 곡선미와 서양 하이패션의 현대성을 교차하는 룩으로 주목을 받았다. 주름진 스커트에 가죽 재킷, 진주 헤어핀에 절제된 화이트 톤 레이어링. 이질적인 조합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시대의 ‘하이브리드 오리엔탈리즘’으로 완성된 감각이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조명의 이면에는, 보다 깊은 생활 트렌드가 숨어 있다. ‘한복’이라는 전통의 기호가 일상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 코드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트렌드 1. ‘기능성’보다 ‘정체성’을 품은 패션
최근 소비자들은 단지 입기 좋고 예쁜 옷을 찾는 것이 아니다. 나의 가치, 나의 배경,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제품을 선택한다. 한복은 지금 그 기준을 만족시키는 최적의 텍스타일 언어로 주목받고 있다.
스타일리스트 배선영은 “전통을 그대로 입는 것이 아니라, 나답게 해석해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한복의 진짜 힘”이라고 말했다. 이는 2024년 기준 소비 키워드로 부상한 셀프브랜딩(Self-Branding), 뉴노멀 라이프스타일, 로컬 스토리텔링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특히 MZ세대 중심으로 ‘나의 문화 기호’를 소비로 드러내는 현상은 강화되고 있으며, 그 대표 아이템 중 하나로 기능성과 미학을 동시에 갖춘 ‘모던 한복’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트렌드 2. 전통소재의 지속 가능성과 감성 소비 혁신
또 하나 주목할 흐름은 ‘지속 가능성’. 전통 한복의 소재는 본래 자연 친화적이다. 모시, 삼베, 명주 같은 소재들은 고온다습한 동아시아 기후에 최적화돼 있으며, 합성섬유보다 환경오염을 덜 유발한다.
또한 한복은 ‘오래 입을수록 멋스러워지는 옷’이란 인식 하에, ‘극단적 유행’에서 벗어난 타임리스 패션(timeless fashion)으로 소비자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는 매해 빠르게 변경되는 글로벌 패션 트렌드 속에서 느리지만 의미 있는 소비를 실천하려는 대안적 흐름과 만난다. 독자에게도 이렇게 질문해볼 수 있다. “당신의 옷장은 얼마나 오래 입을 수 있는 옷들로 채워져 있는가?”
트렌드 3. 전통 미학이 건네는 심리적 안정감
불확실성이 생활화된 시대, 사람들은 안정감 있는 디자인과 정서적 연결을 추구한다. 그 점에서 한복의 곡선과 여백의 미는 단순한 디자인 요소를 넘어 ‘심리적 위로’로 작용한다.
유럽의 컬렉션 현장에서 말 한마디 없이 시선을 사로잡은 것도, 바로 한국 전통 복식의 절제된 아름다움이 만들어낸 심미적 덜어냄의 미학에 있다.
이러한 디자인 철학은 최근 주목받는 '정적 라이프', ‘슬로우 리빙’ 트렌드와 깊이 연결된다.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도 전통적 요소를 일상 스타일에 녹여보는 시도는, 하나의 심리적 자극이자 자아 회복적 도구가 될 수 있다.
'전통을 입는 일'이 현재를 바꾸는 방식
결국, 우리가 한복이라는 전통을 소비에 도입하는 것은 과거를 소환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그리고 다가올 삶의 질을 바꾸는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직장인의 출근복에 한복형 셔츠를 매치하거나, 소셜 모임에서 모던 저고리 재킷을 선택하는 일. 작은 변화지만, 스타일뿐 아니라 정체성 인식, 지속 가능성, 감정적 만족감까지 연결되는 라이프 선택이 되는 시대다.
한복이 말해주는 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삶을 표현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의 하나의 답이다. 지금 옷장을 열어보자. 그리고 단 한 벌이라도, ‘나를 드러낼 수 있는 한국적인 아이템’을 더해보자. 그것이 나와 공간, 그리고 환경을 위해 함께 숨 쉬는 가장 멋진 첫걸음이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