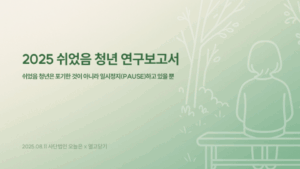장애인의 ‘이동할 권리’가 되살아나야 하는 이유 – 초록여행 사례로 본 제도적 확장과 사회 기대
장애인의 ‘이동권’은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기본 권리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아직까지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기아자동차와 NGO 단체 그린라이트가 공동 운영하는 ‘기아 초록여행’은 그 간극을 실천적으로 좁혀온 대표적 사회공헌 사례다. 이동약자 가정에게 무상 차량 지원과 명절지원금을 제공하는 이번 추석 귀성&가족여행 프로그램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제도적 실험이지만, 더 넓은 사회적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이동의 자유, 아직도 계층화된 권리인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논의는 점차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은 집에만 있어야 한다”는 무의식적 인식이 교통 인프라, 정책 설계, 시민 문화 곳곳에 잔존한다. 대중교통 접근성 부족, 여객시설 내 편의시설 미비, 이동지원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은 여전히 장애인의 이동을 제한한다. 특히 명절이나 여행, 문화생활과 같은 ‘일상 외 확장 경험’에서는 그 격차가 더욱 두드러진다.
초록여행이 제공하는 장비 탑재 차량과 유류비, 경비 지원은 단지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가정에게 ‘추억을 만들 기회’를 열어주는 행위이다. 단순한 교통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관계 회복과 삶의 질 향상, 자존감 회복으로 이어지는 이 사업은 제도적으로 이동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되묻게 한다.
제도는 어디까지 따라왔고, 어디서 멈췄나
기초생활수급자나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 서비스는 지역 편차가 크고, 단발성 운행에 국한되기 일쑤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이동 서비스 지침’이 존재하지만, 기획된 여행이나 장거리 귀성, 가족 단위 이동을 전제로 한 설계는 거의 전무하다. 반면, 민간 주도의 ‘초록여행’은 민감하게 변화하는 사회 트렌드 – 예를 들면 휴식 있는 명절, 가족 중심 여행 –을 담아내며 공공정책이 놓치기 쉬운 ‘삶의 층위’를 포착하는 데 더 적극적이다.
11박 12일의 시간을 허용하고, 서울·제주 등 권역 공간을 정해 전국 분산적 지원을 설계한 점은 특히 돋보인다. 이는 여러 지역에서 자립 생활을 시도하거나 혹은 부모로서 자녀와 함께 지내야 하는 장애인 가정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다. 하지만 지속성과 구조적인 확장력을 갖추기 위해선 제도와의 결합이 불가피하다.
당사자 가족의 이야기,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보도자료에 실린 참여자의 후기는 이 사업의 의미를 수치 이상으로 증언한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아이와의 고향 방문”, “장애인 배우자를 둔 아내와 아이들과 전통놀이를 함께한 명절” 등은 단순히 막힌 교통을 푸는 서비스를 넘어서 삶의 연결을 복원하는 사회복지의 핵심적 의미를 구현한다.
이런 경험은 ‘당사자 중심 정책’ 설계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행정의 잣대보다 경험 중심 설계가 왜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사용하지 못한다면 존재하지 않는 권리’라는 낡은 현실을 깨뜨리기 위해, 비계량적 지표 – 예컨대 정서적 회복, 공동체 회복력 –을 정책 목표에 포함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해외는 어떻게 이동권을 구성하고 있을까
OECD에서는 이미 장애인 이동권을 ‘포괄적 사회참여권’의 일부로 보고 공공 인프라 및 민간 교통서비스 통합 설계를 권고하고 있다. 일본은 교통약자법을 통해 민간 운송사업자에게도 접근성 강화 의무를 부여하고, 독일은 장애인의 여행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여행사 대상 가이드라인을 운영한다. 한국 또한 이러한 접근방식을 참고해 ‘개인별 이동 계획’이 포함된 장기적 모빌리티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동은 권리이되, 치열한 준비가 필요한 권리다
초록여행이 보여주듯이, 제도는 물리적 거리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정서적 간격도 좁혀야 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지금껏 이동권이 의료, 출근, 학교 등 필수 영역에만 초점 맞추어졌다면, 이제는 일상 너머의 삶 – 휴식, 가족과의 재회, 문화적 경험 –까지 포괄해야 한다.
핵심은 이동 지원 그 자체보다, 누구도 이동에서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향한 의지의 문제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식 전환, 정책 담당자의 현장 밀착 설계, 기업의 책임 있는 기획, 마을 공동체의 포용적 태도 없이는 진전되기 어렵다.
특별한 여행은 곧 별다른 권리를 요구하지 않는다. 단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사회가 조금 더 도와줄 뿐이다. 이 작지만 진심 어린 사회적 동행이야말로, 우리가 진짜로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