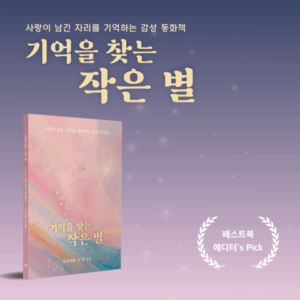무대에서 탄생한 심연의 감정 – ‘프랑켄슈타인: 더 뮤지컬 라이브’가 우리에게 묻는 존재의 의미
2025년 가을, 극장은 다시 한번 무대의 시간을 되살린다. 한국 창작 뮤지컬의 정점이라 불리는 <프랑켄슈타인>이 실황 영화로 재탄생했다. 메리 셸리의 고전에서 출발했지만, 이번에는 스크린 안에서, 규현과 박은태라는 두 존재의 육성으로, 창조와 파괴, 집착과 용서라는 근본적인 인간의 질문을 다시 묻고 있다.
예고편이 공개된 순간, SNS는 마치 오래된 기억을 공유하는 듯한 감동으로 들끓었다. 영상의 짧은 몇 분 안에 담긴 두 배우의 눈빛과 숨결에서 관객들은 다시 심연의 울림을 느꼈다. 관람 예매는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이미 그날의 감정은 다시 공간을 점유하기 시작했다.
전율은 어떻게 스크린이라는 또 다른 무대에 도달하는가
뮤지컬의 가장 본질적인 감동은 '현장성'에 있다. 배우의 땀과 관객의 호흡, 그리고 음악이 만들어내는 생생한 공명. 그러나 위즈온센은 이 무대의 감동을 스크린으로 옮겨오며 영화란 매체가 줄 수 있는 또 다른 감각의 통로를 연다.
무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얼굴의 떨림, 미세한 숨 고르기, 그리고 클로즈업이 주는 감정의 공명. 실황 영화 <프랑켄슈타인: 더 뮤지컬 라이브>는 ‘무대 한가운데에 앉아 있는 듯한’ 착각 이상으로, 우리가 느끼는 고통, 죄책, 연민의 본질을 더욱 짙게 퍼트린다. 특히 Dolby Atmos의 돌출음 속에서 터지는 고통의 절규는, 관객 스스로 ‘괴물’의 입장이 되어 세상의 잔혹함을 마주하게 만든다.
같은 이야기, 그러나 매체에 따라 달라지는 상처의 깊이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은 고전에 기반하면서도 위대한 배반을 선택했다. 원작의 ‘조립된 괴물’ 대신, 실존 인물 ‘앙리’의 얼굴을 한 괴물을 선택함으로써 ‘인간성’이라는 피할 수 없는 렌즈를 들이댄 것이다. 규현이 연기한 ‘빅터’의 광기와 우정, 박은태가 표현한 ‘앙리’의 존재적 분열은 단순한 창조와 피조물의 이야기에서 벗어나, 우리가 타인의 얼굴을 하고 있는 고통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본질적 문제로 확장된다.
스크린 위의 카메라는 이제 배우가 아닌, 바로 관객을 응시하기 시작한다. 무대라는 장막 뒤에 숨어 있던 질문들이 영화적 언어로 시선과 거리감을 재편하며, "나는 과연 누구의 괴물이었는가", "나의 앙리는 누구인가?"라는 고독한 사유를 강제한다.
한 세대의 기억을 아카이빙하는 예술, 그리고 오늘의 우리
2025년, <프랑켄슈타인>의 10주년은 단지 공연의 역사가 아니다. 이 작품이 계속 무대에 오르고, 또 스크린에 이식되며 되살아나는 이유는 단순한 팬심 이상의 시대적 울림이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그날의 공연이 인생을 바꿨다”고 말한다. 누군가는 “무대 위 배우들의 절규에서 자신의 실수한 사랑을 떠올렸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감정을 다시 관람객의 자리에 앉아 되새길 수 있는 시대 속에 산다.
실황 영화라는 매체는 이제 단순한 기록 이상의 시선을 품기 시작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문화 기억을 저장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디지털 애도이며 헌사’이다.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보게 되는 우리는 단지 관람자가 아닌, 그 기억의 공동 증인이 된다.
지금, 우리가 감각해야 할 문화는 무엇일까요?
<프랑켄슈타인: 더 뮤지컬 라이브>는 감정 조각의 모자이크로,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 잠재운 고통의 얼굴을 보여준다. 스크린 앞에 앉아 있는 우리는 단지 한 편의 작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창조해낸 것들 – 사랑, 집착, 용서, 후회 – 그 모든 것들의 잔해 속에서 일어나는 성찰과 마주하게 된다.
그 감정들은 극장을 나오는 순간 공기처럼 곁에 머물며 속삭일지 모른다. "너의 괴물은 누구였니?", "무엇을 다시 창조하고 싶은가?"
이 영화를 보며 삶을 더 가까이서 느끼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자:
- 하루를 보낸 후 거울 앞에 서서, 나에게 가장 많이 상처를 준 얼굴과 가장 많이 사랑한 얼굴이 같은 인물일 수 있다는 걸 떠올려보자.
- 인간이 만든 존재가 인간을 응시하는 순간, 나는 어떤 질문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자문해보자.
-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감정을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무대 위에 한 번쯤 올려보자 – 일상의 언어, 그리고 내면의 뮤지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