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너머의 침묵 – 삶의 균열에서 피어나는 진짜 소통의 얼굴
한 극장이 다시 어둠으로 가라앉는 순간, 관객의 가슴 속에 한 줄기 빛이 남는다. 연극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은 말없이 존재하던 존재들을 무대 위로 불러올린다. 소리 없는 언어, 들리지 않아 생긴 단절, 오해로 깊어진 감정의 강. 이 무대는 누군가 말하지 않았던, 그러나 너무도 말하고 싶었던 역사의 틈으로 향한다.
우리는 언제부터 서로를 오해하게 되었을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엮였지만 가장 멀어진 이들이 있다. 농인 딸, 청인 부모, 그리고 이들 관계에 침식된 세월의 침묵. 이번 공연은 ‘장애’가 아닌 ‘소통의 본질’에 대해 묻는다. 소통이 되지 않는 이유가 과연 귀가 들리지 않아서일까? 혹은 마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일까?
말없이 이야기하는 연극의 언어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의 서사는 여느 비극처럼 시작된다. 아내의 죽음, 남겨진 남편 경수, 그리고 딸 유림. 그러나 평범한 이야기가 평범하게 흘러가지 않는 이유는, 유림이 ‘농인’이라는 설정 속에 있다. 수화를 매개로 한 유림의 세상은, 온전한 언어의 세계 바깥에서 거의 항상 미묘한 착오를 빚는다. 이 연극의 미덕은, 그런 미묘함에서 비롯된 불편함과 불완전성을 포장하지 않고 극 안으로 밀고 들어와 ‘현실의 날 것’으로 보여주는 용기다.
배우 박호산은 단절된 부성애의 외로움을 절제된 감정으로 표현하고, 이지현은 아내로서, 엄마로서 붕괴되어가는 여성의 이중성을 그려낸다. 그러나 무대의 중심을 잡는 건 결국 농인 배우 이소별의 ‘침묵의 연기’이다. 몸짓과 눈빛, 그리고 수화는 언어의 풍경을 재구성하며, 감정이 오히려 더 투명하게 드러나는 역설적 미학을 완성한다.
무대 밖의 혁신, 관람의 감각을 확장하다
이 작품은 단지 감정의 흐름을 조명한 연극에 머물지 않는다. 제작진은 ‘농예술팀장제’를 도입해 수어 기반의 창작 환경을 구축했고, 농인 영상감독이 아카이브 작업을 맡는 등, 창작의 전 과정에 농인의 목소리가 닿도록 했다. 연극이 사회를 향해 말을 거는 순간, 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이는 최근 국내외에서 다양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문화 콘텐츠 창작 방식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영국의 페이퍼드라마 극단이나 일본의 ‘사토유이치 연극실험실’처럼, 언어와 감각의 차이를 포용하는 무대들은 ‘공감 능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미학의 출현을 보여준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도 그 살아있는 사례 중 하나다.
슬픔의 공유는 어떻게 사랑이 되는가
박경식 연출의 말처럼, 이 연극은 슬픔을 기억하며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모색한다. 무대는 우리가 매일 피하고 있는 진실 위로, 소리 없는 시선 하나를 내려놓는다. 유림의 침묵은 외면당한 이들의 분노이자, 또 언젠가 닿기를 바라는 사랑의 언어다. 그 흔들리는 손끝이 우리를 되묻게 한다. “나는 정말 상대의 마음을 듣고 있었는가?”
문화는 때로 '다름'에 귀 기울이는 방식으로, '같이' 사는 법을 가르친다.
지금 우리가 감각해야 할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존재하느냐’다. 이 연극이 던지는 질문을 일상 속에서도 이어갈 수 있다. 오늘 하루, 직접 말로 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을 감정 하나를 글로도, 혹은 눈빛으로도 표현해보자. 누구 하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지나쳐 버릴 수 없는 그 작은 진심을.
![You are currently viewing [아트컴퍼니 행복자], 소리 없는 연극이 전하는 진심](https://prnews.kr/wp-content/uploads/2025/10/아트컴퍼니-행복자-소리-없는-연극이-전하는-진심.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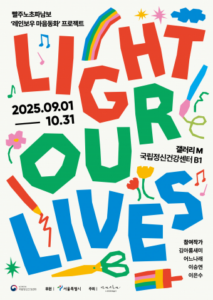
![Read more about the article [도서출판사명], 일본 미술관 건축의 미학](https://prnews.kr/wp-content/uploads/2025/09/도서출판사명-일본-미술관-건축의-미학-247x300.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