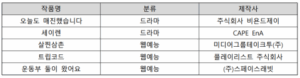한국 창작극의 세계 발화 – ‘시간을 칠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
연극이 우리 삶에 건넬 수 있는 언어는 침묵에서 시작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말하지 못한 것들,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이 무대 위에 형상으로 살아날 때, 우리는 비로소 그간의 거리와 금기를 넘어서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극단 하땅세의 연극 『시간을 칠하는 사람』이 2025년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우수 프로덕션상’을 수상한 사건은 단지 하나의 문화적 표창 그 이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이 내면의 기억과 아픔을 세계인의 감각으로 번역해낸 찬란한 예술적 소통의 증거다.
광주의 시간, 여성의 언어로 다시 그리다
『시간을 칠하는 사람』은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상처를 한 여성의 기억을 통해 풀어낸 작품이다. 그러나 놀랍도록 정제된 언어와 형상, 오브제를 통해 고통을 둘러싼 이야기마저 시적이고 아름답게 승화시킨다. 극의 중심엔 단지 한 사람의 치유나 서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보존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묵직한 질문이 놓인다.
배우들은 조지스퀘어 가든 스튜디오3라는 제한된 물리적 공간 안에서 강의실 테이블, 사과, 종이 등 일상적 오브제를 활용해 마치 시간을 조각하듯 장면을 직조했다. 시공간을 넘나드는 상징과 묘사는 세계 어떤 언어로도 설명될 수 없는 ‘공감의 감각’을 자극하며, 관객의 눈을 정지된 역사 속으로 끌어들인다.
세계는 왜 이 조용한 헌사를 주목했는가
에든버러 프린지는 그 생동성과 실험성으로 세계 공연예술계의 최대 플랫폼으로 여겨진다. 매년 수천 개의 작품 중 ‘아시안 아츠 어워드’에서 극단 하땅세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는 것은 단순한 시각적 우수성 이상의 감각적 혁신과 정치적 진정성을 모두 증명한 결과다.
현지 평론가들은 ‘웃음과 기쁨이 어두운 기억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며, 이 작품이 과거를 현재화해 세계적 정치 현실과도 연결된다는 점을 짚었다. 즉, 이 연극은 한국의 이야기인 동시에, 어느 누구의 것이라도 될 수 있는 ‘보편적 진정성’을 획득했다는 뜻이다.
오브제 연극, 감정의 온도를 통역하다
하땅세는 일찍이 극장이 아닌 공간에서의 무대를 실험해오며 감정의 ‘물성’을 탐색해 왔다. 이번 작품에서도 물성과 조형성의 시너지를 통한 관객 몰입이 특히 뛰어났다. 감정은 대사보다 앞서 움직였고, 시선은 배우의 손끝과 물체의 대비에서 투명하게 전달됐다. 그 방식은 언어 장벽을 뛰어넘기도 했지만, 더 깊이 들여다 보면 이는 ‘서사의 전유’가 아닌 ‘공감의 환대’에 기반한 예술 윤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연극이 동시대 한국 관객과 해외 관객 모두에게 설득력을 가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기억과 망각 사이를 진동하는 슬픔의 공동체이기에, 이처럼 감정을 인간적인 속도로 번역하는 작업은 더욱 절실하다.
우리는 기억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시간을 칠하는 사람』은 단지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되짚는 연극이 아니다. 그것은 질문이다. “시간을 덧칠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색으로 그리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라는 질문. 어쩌면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일상 속에서도, 작은 오브제나 익숙한 공간이 환기하는 기억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 기억들은 말끔히 사라지지 않지만, 공연 예술처럼 다른 언어로 바꿔 말해질 수 있다면 견디고 나아갈 힘이 된다.
그러니, 오늘의 우리는 어떻게 이 질문을 삶에 새겨 넣을 수 있을까? 공연 한 편을 찾아보며 기억해보자. 비극이 아닌 ‘헌사’라는 단어로 고통을 덜어낸 이 연극처럼, 우리의 슬픔도 마침내 누군가에게는 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늘 묻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무엇으로 칠해지고 있는가?”라고. 문화는 늘 그 질문에서 시작된다.